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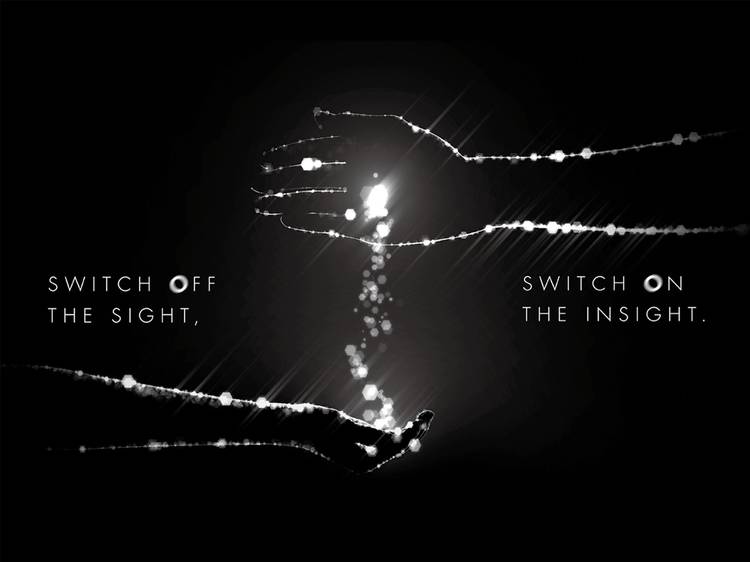
전시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더 세게 눈을 떠봐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전시를 체험하는 사람 여섯 명 중 다섯은 서로 잘 알고 있는 단체 관람객(선생님 모임)이었다. 에디터 혼자 모르는 이들과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안전이 검증된 체험 전시이지만 본능적으로 엄습해오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다. 어둠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에 6명은 3명씩 나눠 머리를 맞대고 팀명을 정한다. 우리 팀은 ‘동동주’. (체험하는 동안 나는 ‘동동주’팀의 ‘주’님으로 불렸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왼쪽 벽을 짚고 일곱 발자국만 걸어볼게요.” 로드 마스터의 목소리에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처럼 모두가 한 발짝씩 나아갔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어색한 미소로 통성명을 한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앞 사람의 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등에 머리를 박거나, 발을 밟게 되는 일도 많았지만 아무도 불쾌해하지 않았다. 전시장은 다양한 테마의 공간(숲, 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방적인 설명을 듣거나 섣부른 질문을 던지는 대신 점점 감각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손끝에 나뭇잎이 만져지면 숲에 왔다는 걸 알아차렸고, 얼굴에 부는 바람을 느끼며 타고 있는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깜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믿을 구석은 로드 마스터뿐이었고, 그녀의 말에 따라 움직이니 사고가 날 일은 없었다. 다양한 코스 중 가장 기대되는 건 카페 체험이었다. ‘다크 카페’라 불리는 그곳에서는 이름 모를 음료를 마시며 편지 쓰는 시간을 가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온 음료라 여긴 음료는 레모네이드였고 쪽지에는 꼬불거리는 글자의 형체만이 남아 있었다.) 빛이 없으니 흐르는 시간에도 둔감해졌는지 100분이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홀로 제주도의 밤 거리를 걷다가 칠흑 같은 어둠에 소스라치게 놀란 기억이 떠올랐다. 해가 지면 깜깜해지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순리인데도 도시의 불빛에 익숙해진 에디터는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 <어둠속의대화> 는 그때와 비슷한 경험이었다. 너무나 당연하게 느낀 빛과 시각이 사라진 순간, 잊고 있던 존재들이 코와 귀와 살갗으로 느껴진다. 보이는 것 때문에 무뎌진 감각들이 비로소 또렷하게 살아난 느낌이었다. 그게 레모네이드의 맛이든, 목소리의 작은 떨림이든. 관람 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한 마음도 들겠지만, 보이는 것에 가려져 있던 어둠의 이면들, 혹은 다른 감각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관람 후 번진 마스카라는 여전히 창피하겠지만.
Discover Time Out original video

